내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동네에는 해발 50미터도 안 되는 동산이 두 곳이나 있다. 밀집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27년 전부터 계획도시로 개발된 이 도시에서 나는 22년째 살고 있다. 그러니 원주민은 아니더라도 꽤 오래된 이주민이긴 하다. 이 도시에서 나는 세 곳의 동네에서 각각 5년, 7년, 10년을 살아왔다. 공통점은 변두리로만 옮겨 다녔다는 것과 동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중 앞서 5년, 7년을 살았던 동네의 동산은 등산로는 있었지만 자연 상태였던 반면, 꼬박 10년째 살고 있는 지금의 동네에 있는 동산은 그 규모가 훨씬 작아서인지 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산책 공원이기에 차이도 있다. 그 공원 산책로는 직업 관리인이 매일 관리를 하고 있어서 꽤 깨끗하다. 산책자가 걷기 편하게끔 길마다 두툼한 왕골도 깔아놓았다. 곳곳에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운동 기구도 설치해놓았다. 주변에는 휴식용 나무 벤치를 마련해 놓았으며 한적한 곳에는 팔각정도 만들어져 있어서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놓았다.
그런 환경은 운동 삼아 산책을 할 때는 일반 동산과 별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조명 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반 동산은 해가 저물면 산책하기 어렵지만 동산 공원은 계절마다 다른 일몰 시간이 되면 산책로를 따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2분음표마다 주홍 불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나처럼 밤 시간이 돼서야 귀가하는 주민에게는 고마운 일이다. 그래봐야 평일 중 하루나 이틀뿐이지만, 초저녁에 퇴근하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어김없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운동화 끈을 조이고 현관을 나선다. 아파트 담장에 직결된 작은 육교를 건넌다. 탄성 바닥재로 포장된 산책로를 따라가면 길가 양쪽에 줄지어 서서 드문 행인에게 배꼽 인사를 하는 가로등들이 주홍빛으로 제 발밑에 원을 그리며 허리를 숙인다. 그 길을 따라 6분쯤 걸어가면, 판타지 동화 속의 거대한 거인이 베개로 삼을 만한 야트막한 동산이 나온다.
그 동산을 조감도(鳥瞰圖)로 보면, 즉 창공에서 활공하는 새의 눈으로 내려다보면, 마치 방금 글자를 배운 어린아이가 써놓은 듯한 숫자 ‘8’의 모양일 테다. 또한 계란 프라이에 빗대면 노른자위다. 그 주위에 흰자위처럼 에두른 평평한 산책로가 있기 때문이다. 탄성 바닥재를 깔아놓아 무릎 관절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충격을 완화해 걸을 수 있도록 만든 인공 산책로에는 날씨만 좋으면 밤 10시가 지나도록 보행인들이 행렬을 이룬다. 그런데 누가 정해놓지도 않았음에도 보행인들은 대부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행렬 지어 걷는다. 아마도 태생적으로 오른발잡이가 많아 그 방향의 회전운동이 더 편한가 보다. 원심력을 이겨내기에 힘을 더 잘 쓸 수 있는 다리가 오른쪽이기 때문일 테다. 빙상 경기 쇼트트랙이나 올림픽 육상 종목 400미터 계주의 방향이 그렇듯 말이다.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트랙까지가 산책 공원에 포함될 텐데, 낮이든 밤이든 그 동산 공원은 실제 동산보다 트랙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더 많다.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기 위해 두세 분씩 어울려 나란히 걷는 일석이조의 아주머니들도 있고,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비대한 제 몸을 싣고 어기적어기적 힘겹게 걸음을 놓는 코끼리 아저씨는 먼저 가라는 뜻으로 본인은 가장자리로 걷는다. 그러면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ㄴ자로 굽힌 팔을 시계추처럼 흔들며 성큼성큼 걸어온 날씬한 아가씨가 두세 배의 속도로 코끼리 아저씨를 추월한다. 반달 모양의 그 트랙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내 걸음으로 13분쯤이다. 간혹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혼자 천천히 걷는 아주머니들도 있다. 내가 트랙을 두 바퀴 돌아올 때까지 산책로의 같은 자리에 선 채로 드라마에 심취해 있는 분도 있다.
날이 갈수록 부쩍 늘어나는 현상은 반려견과 동행하는 산책자들이 많다는 것. 한두 마리는 보통이고 어떤 분들은 눈썰매를 끄는 개들을 앞세운 양, 서너 마리의 자그마한 개들의 몸통에 이어진 끈을 관리하기에 벅찬지 걸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보게 된다. 문제는 종종 갈팡질팡하는 반려견들과 함께 트랙을 도는 일을 불편해 하는 산책자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니 훗날에는 반려견 전용 산책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꼭 그 이유는 아니지만, 나는 트랙 산책로에 산책자와 반려견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다 싶으면, 낮이든 밤이든 동산 속으로 들어간다. 오르막 내리막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어서 걷는 속도를 일정히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동산 속 산책로는 비교적 한산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산도 산이기에 계절에 따라 꽃과 나무들이 곳곳에서 걸음을 붙잡는다. 봄이면 매화, 진달래, 벚꽃, 원추리, 철쭉이, 여름이면 짙푸른 활엽수와 연둣빛 풀벌레들이, 가을이면 선명한 단풍과 밤톨과 도토리들이, 겨울에는 새하얀 눈송이들이 나를 멈춰 세우는 주인공들이다. 지난 겨울에 나는 그 동산 공원을 틈만 나면 걸었다. 평일 한밤이든 주말 한낮이든 아무리 고민해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직장 일과 내 인생의 길을 머리에 이고 영하 13도인 날에도 칼바람을 마주하며 계속 걸었다. 그러던 2월 어느 날, 나는 마음에 도장을 찍었다. 나처럼, 어느 동산 공원에서든 혼자 뚜벅뚜벅 걷는 어느 누군가는 어쩌면 자신의 거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거울 사이에 서 있으면 끝없이 자신을 비추고 있는 거울 속의 거울 속의 거울 속의 누군가처럼 말이다.
※ 편집자 주
[마음을 치는 시(詩)]와 [생활의 시선]에 연이어 윤병무 시인의 [때와 곳]을 연재합니다. 연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과 장소’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은 오래되어 역사의 범주일 수도 있고, 개인 과거의 추억일 수도 있고,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훗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늘 일상의 공간에서 발 딛고 서 있는 희로애락이 출렁이는 삶의 현장입니다. 너무 익숙하거나 바빠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그 ‘곳’을 시인의 눈길과 마음의 손을 잡고 함께 가만히 동행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의 구체적인 현지와 생생한 감수성을 잠시나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 필자 소개
윤병무. 시인. 시집으로 ‘5분의 추억’과 ‘고단’이 있으며, 동아사이언스 [생활의 시선]을 연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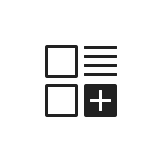



![[때와 곳 31] 빈소: 슬픔의 무게를 함께 드는 곳](https://image.dongascience.com/Photo/2017/11/15108941187761.png)
![[때와 곳 30] 옥상: 웃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https://image.dongascience.com/Photo/2017/11/15105381236352.jpg)
![[때와 곳 29] 점집: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곳](https://image.dongascience.com/Photo/2017/11/15096848073597.png)
![[때와 곳 28] 우편함: 운명의 향방이 갈리는 곳](https://image.dongascience.com/Photo/2017/10/150899181508.png)













 동아사이언스
동아사이언스
 디라이브러리
디라이브러리
 DS스토어
DS스토어
 팝콘플래닛
팝콘플래닛